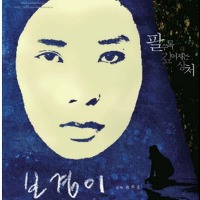*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단디가는 작은 편집장>
어깨가 닮았다, 금샘단오잔치 '아이가 하늘이다'
글 : 조혜지(학생) esc2277@naver.com
사진 : 이장수 leeseeda@naver.com
1999년,
두 살 터울의 남동생은 어릴 적 아버지 품이 아니면 잠들지 못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백과사전을 뒤져보는 대신 아버지 손을 붙들었고, 아버지는 언제나 최선의 답을 아들에게 구해줬다.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믿었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순간, 서로의 살갗을 비볐다. 그동안 아비는 아들의 성장을 쟀으며 아들은 아버지의 크고 넓은 품에서 가장 편한 안식을 취했다.
2013년,
유부초밥, 잡채, 고기산적, 떡, 과자,… 헤아리다 손가락이 모자라 포기한다. 임금님 생신상도 이보다 더 푸짐했을까. 머리에 빨강 노랑 꽃 매단 아이들이 운동장을 가로세로 가로지르며 깔깔 웃는다.
“아빠, 나도 저렇게 해줘”
아빠의 바짓단을 쥐고 흔들며 졸라대는 예닐곱 살의 남자 아이. 아빠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번쩍 들어 목마를 태운다. -덩덩덩덩…
한바탕 ‘덩’이 몰아치자 아이를 업고 목마태운 아빠들이 운동장 복판에 모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다 다르다> <아이가 하늘이다> <천지밥상> <함께살자> 둥글고 큼직한 글씨가 군데 군데 박힌 깃발들이 선두에 오르면 아이와 한 몸이 된 아빠와 엄마가 풍물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어깨춤을 춘다. 신이 오른 어깨 장단에 아이들도 까르르 웃음이 터진다.
2001년,
아들은 교복을 입었고, 아버지는 양복을 벗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출근준비를 시작했다. 함께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은 사실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돼버렸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아버지의 시선을 마주하는 걸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하게 됐다. 아비가 아들의 살갗을 만질 수 있는 일도 점점 드물게 되었다. 이른 새벽에 퇴근하며 살금살금 아들 방에 들어와 살며시 손을 잡아보는 게 전부였다.
2013년,
운동장 한 축에 길게 차린 제상엔 홍동백서의 질서가 없다. ‘김지아 가족-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한수영 어린이-행복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각 추렴한 음식들엔 저마다의 축원 메시지가 걸려있다.
“아빠, 아프나?”
아빠의 어깨에 매달린 아이가 안색을 살피며 묻는다.
“아프지~” “내릴까?”
쭈뼛쭈뼛 묻는 아이에게 아빠가 답한다.
“내려오면 재미가 없잖아~”
쿵쿵 솟대를 찧으며 다시 한 번 놀판이 시작된다. 꽹과리를 잡은 상쇄 어른이 아빠들을 몰고 뛰다 걷다를 반복한다. 우르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서너 바퀴 돌다가 제상 앞에 우뚝 멈춰선다.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을 모시고 한바탕 밥상 굿이 시작된다.
2010년,
아들은 이제 제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세상을 배운답시고 험한 일도 마다않고 뛰어들었다. 페인트 공장에서 머리가 아찔한 약품 냄새를 맡으며 라벨을 부착하는 일도 했고, ‘노가다’라 불리는 공사장 잡역부 일도 해봤다. 만만찮은 등록금을 채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더 이상 손을 내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컸다.
2013년,
“행복하고 놀림 안 받게 해주세요.”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로 끝나는 축원들이 연거푸 쏟아진다. 아빠의 얼굴이 사뭇 진지해진다. 목마 탄 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진심으로 빈다. ‘내 아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을 먼저 배운 부모는 아이에게 ‘험난’과 ‘각박’을 일러주기 이전에 먼저 ‘험난’과 ‘각박’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빠, 칸쵸 사주면 안돼?”
방글 웃는 아이의 얼굴엔 아직 근심이 없다. 아빠도 아이를 마주보며 근심을 잊는다.
2013년,
시작한 일이 꽤 고된지 동생은 한밤중에 근육통으로 끙끙 대는 일이 많아졌다. 물끄러미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가 동생을 흔들어 깨운다. 잠에 취해 눈을 부비는 아들을 바로 앉히고 어깨며 팔이며 주무르기 시작했다. 떡 벌어진 아들의 어깨를 주물럭거리며 아버지가 묻는다. “니가 올해 몇 살이고?” “스물하나요.” “키가 너그 또래보다 쪼매 크재?” “그냥 보통이에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내 닮았으면 많이 컸을낀데.” 두런두런 긴 대화를 이어간다. “아빠, 화물기사 조수들은 원래 그렇게 욕을 잘해요?” “사람마다 다르지, 와 누가 니한테 욕하드나?” 눈을 감은 채 아버지의 안마를 받던 아들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간다. 어깨에 따뜻한 힘이 실린다.
<아이가 하늘이다> 솟대에 내걸린 자보가 펄럭인다. 아직도 아빠의 목에서 내려오지 않은 꼬마가 과자를 우물거린다. 1시간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빠의 어깨는 미동도 없이 우뚝 아들을 받히고 있다. 아버지의 어깨만큼 아이의 어깨가 자라면 꼬마는 언젠가 문득 알게 될테다. 저를 위해 넓혀온 어깨만큼 아버지도 부단히 자라야 했음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을 것이다. 세상에 ‘아이’아닌 어른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아이가 하늘이다’